로봇자동화, 기존 챗봇 수준을 ‘재포장’한 경우 많아
전 세계 수천개의 AI에이전트 모델 중 진짜 ‘에이전트’는 130개 불과
빅테크 등 공급업체 ‘과대광고’로 ‘AI에이전트 시대’인양 현혹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현재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AI에이전트의 상당수는 ‘무늬만의 에이전트’라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준다. 사실상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없는 ‘에이전트 워싱’이 많다는 것이다. 27일 이런 주장이 다름아닌 국제적 권위를 지닌 가트너에 의해 제기되어 더욱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트너는 심지어 “대부분의 에이전트 AI 도구는 단순히 RPA(로봇자동화)나 기존 챗봇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까지 혹평했다. 그래서 그 중 절반 가까이는 1~2년 내에 폐기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에이전트’ 절반, 1~2년내 쓸모없어져 폐기
그러면 현재 에이전트 AI 도입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기업은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 이에 가트너는 과감히 “지금의 AI에이전트 절반 정도는 그 용도가 기대에 못미쳐 멀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 “현 수준의 ‘에이전트 AI’ 도구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제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실제로 가트너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AI에이전트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 투자 수익률(ROI) 부족, 부실한 관리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처럼 에이전트 AI 활용과 관리가 대부분 미숙한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근엔 ‘AI에이전트 붐’을 예고할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빅테크를 비롯한 개발업체들의 ‘과대광고’와 과잉 홍보도 필요 이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가트너가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에이전트 AI는 진정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저 기존 자동화 로봇이나 챗봇을 ‘재포장’한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사실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등 이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에이전트 AI 프로젝트는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실험이나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고 해야 정확하다. 그들 대부분은 ‘과대광고’에 의해 그 효용과 성능이 부풀려지고, 그렇다보니 치밀한 용도나 관리 노하우도 없이 무턱대고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에이전트 AI, 초기 실험, 개념 증명 단계
구축 비용과 기술,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AI에이전트로 실행하려던 프로젝트가 실제 제대도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빅테크 등은 “과대광고를 과감히 버리고,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AI에이전트의 확산과 보급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다. 올 초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벌써 대상 기업 5곳 중 한 곳이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이 3분의 1은 앞으로 기술 추이를 보며 도입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이전트 AI는 기대한 만큼의 가치나 투자 수익률(ROI)을 제공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 성능이나 기술 수준 역시 ‘광고’ 내용엔 크게 못미친다. 복잡한 비즈니스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지침을 따를 만큼의 성숙도나 실행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AI에이전트를 도입한 사례를 보면, 정작 ‘에이전트적’ 구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대부분의 ‘에이전트 AI’ 도구는 실제로 ‘에이전트적’(인간을 대체할 능력)이지도 않다.”는 의구심도 따른다.
나아가선 “대체 왜, 굳이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애초 이는 인간을 대신할 만큼, 인간의 조수 내지 비서와도 같은 역량을 갖춘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는 용어부터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다.
가트너가 지적했듯이,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한 많은 공급업체가 이 용어(AI 에이전트)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기존의 AI 비서나, RPA 도구, 챗봇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를 두고 가짜 에이전트, 혹은 ‘무늬’만의 에이전트란 뜻의 ‘에이전트 워싱(agent washing)’이라고 이름붙였다. 실제로 현재 시중엔 수천 개의 공급업체가 AI에이전트를 자칭하며 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AI에이전트 제품은 13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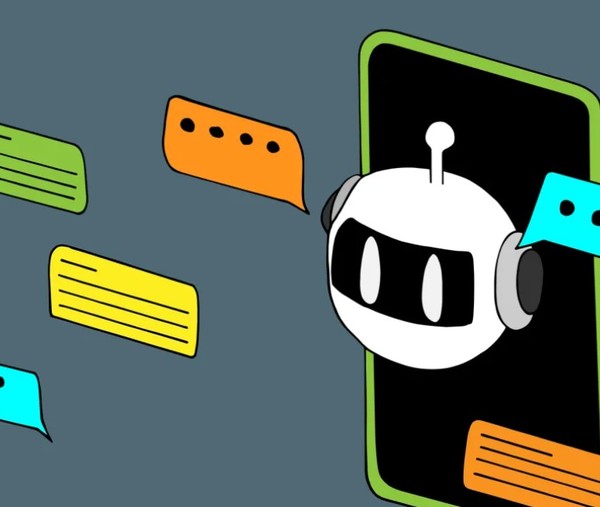
기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은 결코 처음은 아니다. 이미 3년 전 ‘생성AI 붐’이 시작된 이후 업계 관계자들은 우후죽순 공급업체들이 난립하면서, “AI 워싱” 논란이 일었다. 즉 기술이나 트렌드 초기 단계에는 이를 둘러싼 과대 광고가 난무한다. 그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AI 기반’으로 재포장하는 상황이 잇따르곤 한다.
새 기술 선보이는 시점엔 ‘워싱’ 현상 발생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에이전트 AI 프로젝트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해보인다. 그러나 결국 ‘쭉종이’가 걸러진 진정한 AI에이전트 기술이 살아남을 것이란 낙관론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AI 도구들이 기업에 수익과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또 다른 시장분석기관인 카운터포인트는 “2028년까지 일상적인 업무 결정의 15%가 AI 에이전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같은 시기엔 기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3분의 1이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 외의 전문가들이나 전문매체들 역시 AI에이전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부가가치나, 투자 수익률 전망이 있을 때에만 이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또한 기술적 미숙함 외에도,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AI 에이전트를 통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기술적 복잡성과 (양자의 통합을 위한) 워크플로우 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이전트 AI 도입은 개별 작업 효율을 높이기보단, 회사 차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일상적인 워크플로에는 (로봇) 자동화를 활용하며, 간단한 검색에는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