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진 계기 미국 등 불안감 급증, “대만 집중은 위험” 목소리 높아
美정부 인텔 등 ‘반도체 자급’ 행보 빨라질 듯, “그러나 단시간에 대체 불가”
전문가들 “대만에게 ‘반도체’는 미국 붙잡아두는 지정학적 생존 담보 수단”

[애플경제 김홍기 기자] 대만 지진을 계기로 대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규모 7.4의 지진이 대만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와 AI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춘 TSMC가 하루 이상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TSMC측은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밝히지만, 여전히 지진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미국 등 서방세계와 외신들 간엔 “TSMC 등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중국의 침공 등과 같은 사태로 TSMC의 공정이 중단될 경우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까지 할 정도다.
당시 규모 7.4의 지진으로 대만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천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물론 대만의 재해방지 시스템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대만은 평소에도 흔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이에 대비한 방어 메커니즘을 잘 구축해두었다. 엄격한 건축 법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색 구조팀과 지원 자원 봉사자들은 잘 훈련되어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도 지진에 대응한 매뉴얼을 숙지하며 실천하고 있다.
세계경제 ‘과도한 대만 의존’ 일깨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만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평소 늘 지적해왔듯이, 이번 지진은 세계 경제가 대만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다.”면서 “이 작은 섬나라는 세계 첨단 반도체의 80~90%를 생산하며, 그 중에서도 TSMC라는 한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방재시스템으로 인해 이번에도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칩 생산 공장들은 걱정했던 것보단 지진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작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큰 위협은 대만의 독립적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중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은 그런 복합적 위기 요인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은 애플 아이폰의 핵심 프로세서와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AI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엔비디아 GPU 등을 비롯해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 중심 역할을 하는 TSMC는 세계 최고의 복잡한 AI칩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등이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해서 TSMC 의 공정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이를 사실상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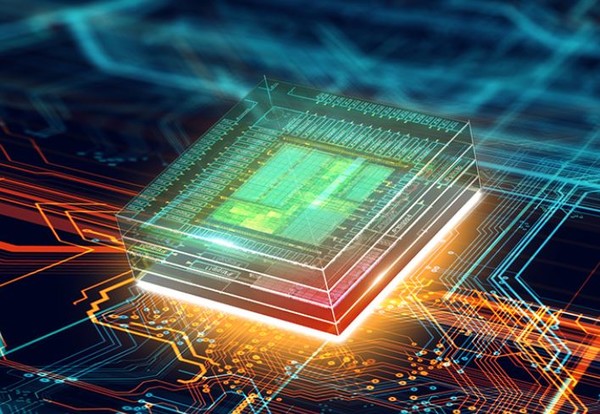
전문가들, 수시로 대만 집중의 ‘위험성’ 경고
이런 유려는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 높다. 지난 2022년에 책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칩 전쟁 :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술전쟁’>에서저자 크리스 밀러(Chris Miller)는 “글로벌 칩 제조가 어떻게 그렇게 불안정한 곳에 집중되게 되었는지 의아하다”면서 “만약 TSMC를 붕괴시키는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독일의 싱크탱크인 ‘Stiftung Neue Verantwortung’도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려하며 “대만 한 지역에 대한 과도한 반도체 집중과 의존은 장차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처럼 위험하다보니, 미국 등 서방세계에선 첨단 반도체 칩 생산지역의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 같은 기업이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곳의 생산 기지 등)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현재 백악관이 계획한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은 전 세계 첨단 칩의 10% 미만을 생산하던 수준에서 20%까지 점유유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및 보조금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산업 정책에 참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이런 반도체 자급 움직임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더욱 그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얼마 만큼 손쉽게 달성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언론“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한탄도
블룸버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될 것일까”라고 한탄쪼의 칼럼을 내놓기도 했다.
애초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를 처음 발명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모색하던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인건비가 싸면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지닌 대만을 염두에 두고 생산시설을 집중시킨 것이다. 블룸버그의 표현대로 당시는 그게 “올바른 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으로서도 이런 ‘반도체 칩 전쟁’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대만으로선 반도체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이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애초 대만 굴지의 대기업이나 부호들이 앞다퉈 TSMC에 투자한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대만 정부는 미국기업들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반기며,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 결코 경제적 측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이해관계, 즉 안정적인 양안관계와자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생산하는 제품이 미국 기업에 더 중요하면 할수록 대만의 운명 또한 미국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다. 즉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만의 반도체 칩 산업은 대만의 국방과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어기제라는 해석이다.
이에 당장은 TSMC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 등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또 삼성전자나 인텔 등이 이를 대신할 만한 생산역량을 갖추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과도한 반도체 산업 지배가 국제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진단은 비단 이 매체만의 우려가 아닌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