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구수’로 입체영상 시야각 재정의
“상용 홀로그램 전자기록장치 이용해도 충분한 시야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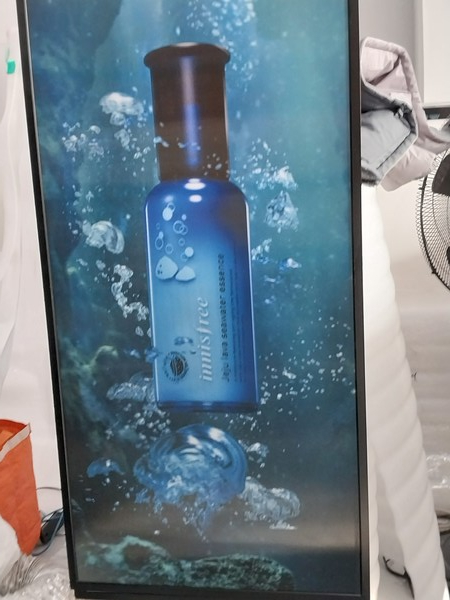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흔히 디스플레이는 화소를 키움으로써 시야각(角)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 표시소자로 알려진 디지털 홀로그램 기록장치를 통해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좁은 시야각을 넓히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어 상용화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국내에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을 확대하기 위해 또다른 원리를 이용한 방안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히 디지털 홀로그램은 낮은 샘플링에서도 고주파수 대역이 소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래서 홀로그램 표시소자 화소 크기에 상관없이 홀로그램 영상 분해능을 결정하는 ‘개구수’를 유지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해 고주파수 영역으로 확장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만들고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홀로그램 화소 크기를 줄이지 않고도 영상 시야각을 기존 3.8도에서 13.1도로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시야각 확대의 화소 크기 기반 접근방법에서 탈피,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최대 걸림돌로 알려진 기존 3.8도 내외의 협소한 시야각 문제를 해결할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아날로그 필름 홀로그램처럼 30도 이상의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빛의 파장 정도인 수백 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진 홀로그램 전자기록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용소자의 화소(pixel) 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에 머물러 4도 이내의 협소한 시야각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연구원은 “시야각 확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소자들을 공간적·시간적으로 다중화하거나 나노미터(㎚)급 표시소자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술적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홀로그램 영상 시야각이 디지털 홀로그램 화소크기에 대한 ‘회절각’보다는 홀로그램 영상 ‘분해능’에 근원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영상 분해능을 결정하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구수(開口數)를 사용해 홀로그램 영상 시야각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상용 홀로그램 전자기록장치를 이용해도 충분한 시야각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연구진은 “개구수가 클수록 분해능이 좋아지는데 개구수는 홀로그램의 크기와 영상이 뜨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로써 홀로그램이 뜨는 위치에 따라 분해능이 달라지고 분해능은 결국 시야각과 관련이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8마이크로미터 픽셀을 갖는 홀로그램 전자기록장치라고 해도, 거리를 충분히 가까이해 영상을 띄우면 시야각은 이에 비례해 4배, 8배 커져 30도 이상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디지털 홀로그램 패턴을 분석하여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수치해석과 광학적 실험을 통해 시야각 확대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역시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즉, 시야각을 3.8도에서 두 배 증가시킬 때 홀로그램 영상 크기도 두 배 커져야 한다. 이때 영상이 중첩되어 보이는 문제가 생겨 고차 회절항을 필터링해줘야 한다는게 문제다.
연구진은 “앞으로 광학적 고차 회절항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광학적 필터링 방법을 개발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실용화 연구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 홀로그래픽콘텐츠연구실 채병규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도 증강현실에 사용하는 홀로그램 근안 디스플레이 아이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