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업무 종사자보다 어중간한 숙련도의 전문가 일자리가 위험
하위노동자, 단순․반복작업 AI활용하며 저임금 고용 지속
고도의 난이도․숙련도 상위 전문가들, ‘AI활용으로 더욱 입지 강화’
“사진․영상 제작․배포 스튜디오, 스마트폰․유튜브로 대체”도 그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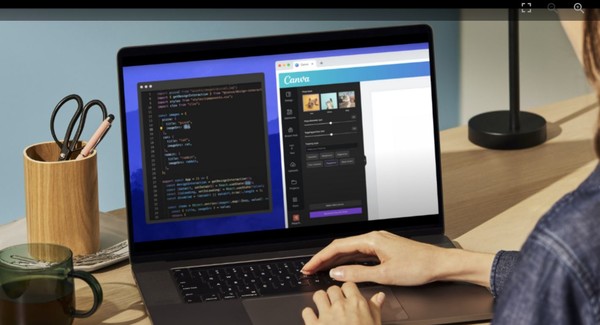
[애플경제 전윤미 기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생산에 투여하는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전문가, 전문가, 일반종사자로 나누었을 때 중간 수준의 평범한(mediocre) 전문가나 노동자들이 AI기술에 의해 가장 많이 대체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의 질을 상·중·하위로 나눴을 때 역시 중간 수준의 전문노동에 의한 중간 정도 품질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적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에 노동과 업무 수준이 낮을수록 AI에 의한 대체가 많을 것이란 통념과는 다른 것이어서 특히 눈길을 끈다. 산업연구원의 길은선, 조은교 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컴퓨터의 보급은 경제 전체의 일자리 양극화를 가져왔으나, AI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유사하게 ‘동종 산업’ 내에서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AI 기술은 창의력과, 비정형의 인지언어 능력 등이 필요한 업무에서도 평범한 전문가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 노동, AI가 일자리 대체’ 통념 깨
이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나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간에도 특히 노동의 난이도나 숙련도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AI기술에 의해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거나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하위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AI기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중간 수준 전문가보다 하위 단계에 있던 일반종사자들의 업무능력도 질적으로 크게 높아진 탓도 크다.
또한 AI기술을 업무 전반에 활용하다보니 비전문가들의 입사와 투입이 늘어나는가 하면, AI시대일수록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비정형의 판단능력이 필요한 상위 전문가들이 더욱 필요하게 된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들 상위 전문가들 고용도 대거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도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AI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존 중간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나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한다. 즉 “더 이상 (중간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품엔)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중하위급 숙련도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거나, 소비자들이 아예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직접 AI로 중간 전문성 필요한 상품 조달
산업연구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필름 카메라를 들었다. 예정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굳이 현상소를 찾아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을 인화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직활용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소비자들이 굳이 현상소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현상 스튜디어 수준의 중하위(혹은 중간수준)의 소비시장이 소멸되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어중간한 숙련도의 전문가들은 고도의 상위전문가와 하위 일반노동자 사이에서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이 ‘하위공급자’로 표현하는 단순업무직 일반종사자들도 AI를 활용해 종전의 중간 숙련도의 전문가 수준만큼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외부에서 이들 중간 전문가들의 일을 맡아할 비전문 노동자들도 대거 고용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도 있다.

기업으로선 중간 수준의 전문가만큼 일을 해내면서도 인건비가 그 보다 싼 보조인력이나 일반종사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길은선 연구원 등은 “제조업에서 기계장치제어 업무에 컴퓨터 SW를 도입하면서 ‘생산기술자’의 고용은 줄어들지만, 단순노무직 고용은 꾸준히 증가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산업 밖 일반인의 공급자 신규 진입 현상”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종전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제작 전문가들만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급, 배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스마트폰, 유튜브 등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위 전문가들, AI로 중간 전문가 영역도 침범
더욱이 ‘상위 전문가’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종사자 숫자의 증가도 중간 수준 전문가들의 설땅을 좁게 만든다. 이른바 ‘대가’나 최고 베테랑 수준의 우수한 전문가는 기존 역량에다 AI까지 직접 활용하면서 생산 시간 절약은 물론, 중간 전문가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다.
길 연구원 등은 프랜차이즈형 기업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즉, 식품가공업과 콜드체인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유명맛집의 최고 요리사는 재료 손질 등 일부 공정을 아웃소싱하며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상품·서비스 시장을 공유하는 소비자나, 비전문가, 상위 전문가가 AI를 활용하면서, 중간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영역을 다각도로 잠식할 것”이라며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업계 생산자 내의 양극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 수준의 전문가나 평범한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산업연구원은 이른바 ‘사진 촬영과 처리업’의 사례를 들었다. 즉,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필름현상과 사진인화 수요가 거의 소멸되다시피했지만, ‘사진 촬영 및 처리업(KSIC 733)’은 그 규모가 최근 10년 간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개인행사용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필요한 분야가 새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연구원의 전망은 보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 그 보단 신시장 개척과 함께 노동 층위의 변경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에 있는 고도의 전문가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일반종사자 수준의 눈높이로 합류하는 등의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후자보단 전자가 바람직할 것이란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