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교수, 신간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종부세, 돈이 되는 '똘똘한 1채' 선호 심화시킬뿐"
[애플경제 조시영 기자]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시세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신간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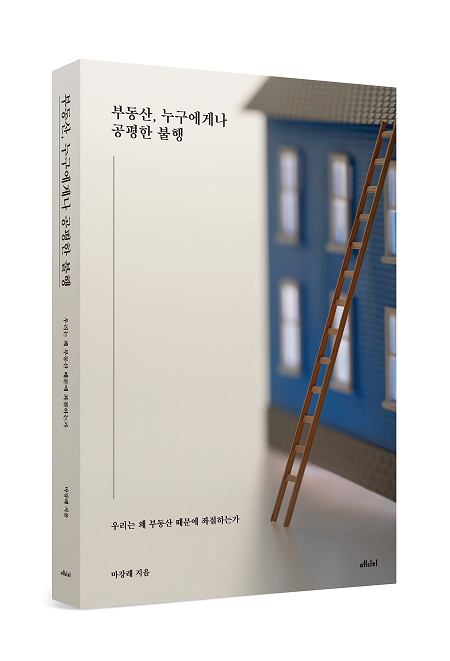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이달 출간한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메디치미디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한 책이다. 마 교수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는 데 전력해온 인물이라고 출판사는 소개했다.
저자는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지 등을 조명한다.
마 교수는 현장과 밀착한 도시계획·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연구자로서, 화려한 불빛 속에 감추어진 집값 폭등이 낳은 박탈감, 무주택 청년들의 상실감 등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동시에 혼란을 타개할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마 교수는 신간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 힘’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올리는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 어떠할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토 공간의 쏠림 현상을 촉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주택 공급은 더 큰 수요를 부른다고 그는 생각한다. 마 교수는 ‘수도권의 대항마인 메가시티를 지방에 구축하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2장 <무엇이 집값을 끌어올리는가>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올리는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여기서는 낮은 금리, 넘쳐나는 돈, 주택 공급 부족,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 등을 살핀다. 3장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에서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읽는이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부터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 교수가 말하는 한국 아파트값 상승의 억제법 요약.
■종부세 올리면 ‘역효과’ 생기니 올리지 말아야
저자는 종부세가 올라가니 똘똘한 1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기서 똘똘함은 ‘돈이 된다’는 뜻이다”라며 “다주택자들은 돈이 되지 않는 집부터 처분하기 시작했다. 지방 중소도시, 지방 대도시, 경기·인천, 서울(비강남), 서울(강남)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은 유별나다”라며 “이들의 주택은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한 돈을 어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 사실 돈을 까먹는 것이나 다름없고, 주식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진다는 것.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을 떠나지 못한다고) 마 교수는 “집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돈 되는 1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많은 다주택자가 이런 생각을 하니,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대항마, 지방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마 교수는 '수도권의 대항마'가 어떤 모습일지 조금씩 구체화 되는 중이라며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은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길을 잃었기에 부동산 이외의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 교수는 책을 통해 “중앙정부는 새로운 투자가 지방 대도시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함께 뛰어야 한다”며 “넘쳐나는 돈이 지방의 생산적인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지방이 사는 길이고 수도권도 사는 길이다”라고 역설했다.

